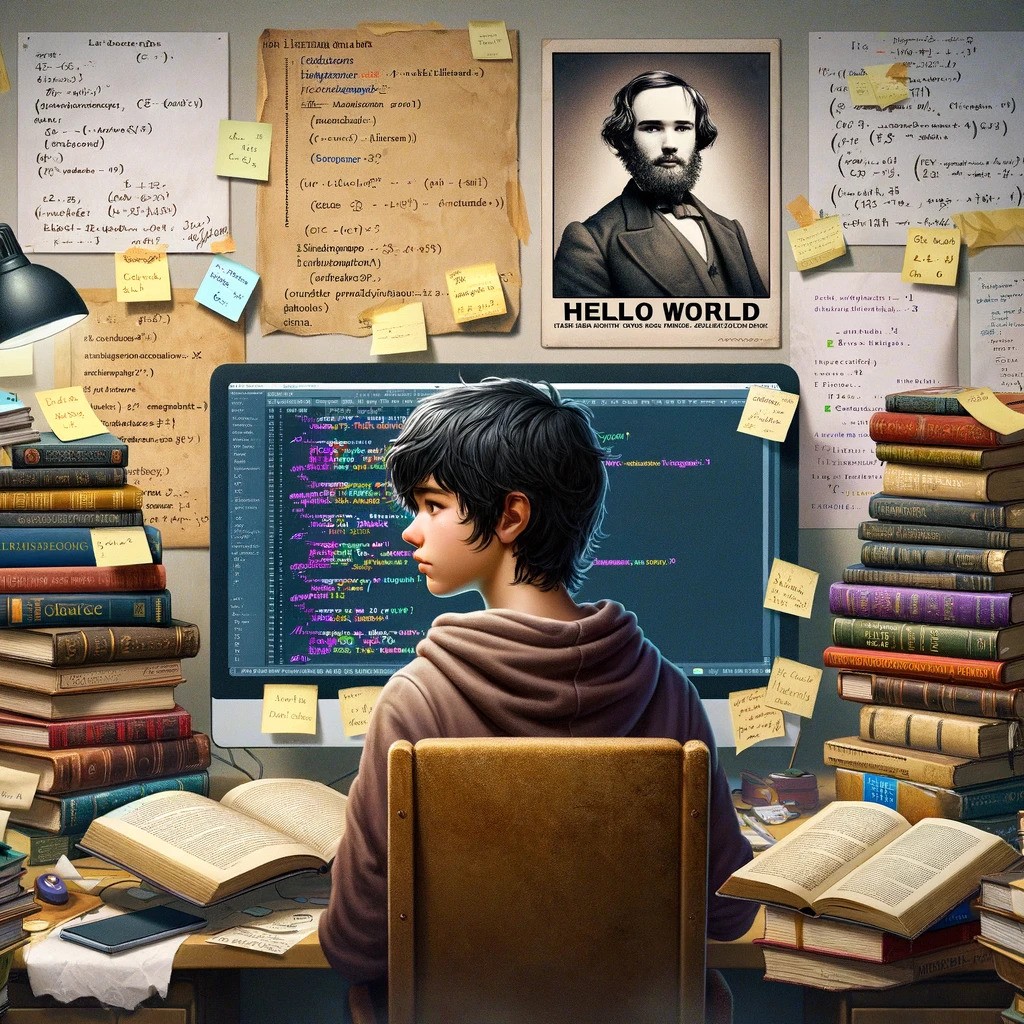Table of Contents
어느 날 아이와 함께 그림책 『파랑이와 노랑이』를 읽었습니다. 단순한 색종이 콜라주와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어린이에게 색의 혼합과 친구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따뜻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책장을 덮고 나니,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겉모습이 바뀌면, 사람들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
초록이가 된 파랑이와 노랑이
책 속에서 파랑이와 노랑이는 친구입니다. 서로 껴안자 초록이로 변합니다.
하지만 초록이가 된 그들을 부모님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슬픔 속에서 두 친구는 원래 색으로 돌아오고, 다시 가족에게 받아들여지죠.
겉모습이 바뀌면 ‘나’는 사라지는 걸까요?
이 짧은 이야기는 단지 색깔 놀이가 아니라, 정체성과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
성인문학과 예술에서 다시 묻는 정체성
이런 질문은 아동문학만의 것이 아닙니다.
성인문학, 영화, 철학, 심리학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이죠.
『변신』(프란츠 카프카): 주인공이 벌레로 변하자, 가족은 더 이상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면은 그대로인데 외형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닌가요?
『페이스오프』(영화): 두 남자가 얼굴을 바꾸자, 그들의 삶과 관계도 뒤바뀝니다.
외모가 곧 정체성일까요? 사람들은 나의 무엇을 보고 나를 알아보나요?
『1984』(조지 오웰):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과 언행만으로 사람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전체주의 사회.
진실한 나의 모습은 얼마나 쉽게 지워질 수 있을까요?
『빌러브드』(토니 모리슨): 피부색과 과거의 낙인이 개인의 존재 자체를 규정합니다.
내가 겪은 고통과 사랑은, 외적인 조건보다 덜 중요한 걸까요?
---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책, 어른들이 되묻는 질문
『파랑이와 노랑이』는 단순한 색 혼합 이상의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색이 변한 친구를 알아보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은,
사회가 외형적 기준으로 사람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겉모습, 직업, 성별, 나이, 피부색...
우리는 얼마나 많은 '초록이'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어른이 되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나임을 증명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아이에게, 나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네가 누구인지 나는 알아. 네가 어떤 모습이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마무리하며
아이와 함께 읽는 그림책 한 권이, 우리 마음속 철학책 한 권을 꺼내 들게 했습니다.
『파랑이와 노랑이』는 결국 묻습니다.
“당신은, 나의 색이 바뀌어도 나를 알아봐 줄 수 있나요?”
- Total
- Today
- Yesterday
- speaking
- PEFT
- t5
- Python
- #패스트캠퍼스 #패스트캠퍼스ai부트캠프 #업스테이지패스트캠퍼스 #upstageailab#국비지원 #패스트캠퍼스업스테이지에이아이랩#패스트캠퍼스업스테이지부트캠프
- RAG
- #패스트캠퍼스 #UpstageAILab #Upstage #부트캠프 #AI #데이터분석 #데이터사이언스 #무료교육 #국비지원 #국비지원취업 #데이터분석취업 등
- 파이썬
- Hugging Face
- LLM
- nlp
- 해시
- 오블완
- #패스트캠퍼스 #패스트캠퍼스AI부트캠프 #업스테이지패스트캠퍼스 #UpstageAILab#국비지원 #패스트캠퍼스업스테이지에이아이랩#패스트캠퍼스업스테이지부트캠프
- Github
- English
- 손실함수
- cnn
- Transformer
- 티스토리챌린지
- recursion #재귀 #자료구조 # 알고리즘
- 코딩테스트
- classification
- clustering
- LIST
- Array
- 리스트
- Lora
- git
- Numpy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